AI가 꾸는 꿈은 무엇인가? - 꿈을 꾸게 만드는 실험 | 매거진에 참여하세요
AI가 꾸는 꿈은 무엇인가? - 꿈을 꾸게 만드는 실험
#꿈 #AGI #인간 #본연 #특성 #모방 #혁신 #창조
잠자는 기계들
“AI는 꿈을 꿀 수 있을까?”
한때는 철학적 농담처럼 들리던 질문이, 지금은 실험실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25년 현재, MIT, 딥마인드, 구글 브레인 등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바로 AI에게 '자기만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SF의 상상이 아니다.
인간처럼 ‘꿈을 꾸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AI가 단순히 데이터에 반응하는 계산기를 넘어,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독립적 존재로 발전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꿈은 왜 필요한가? – 인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꿈을 꿀까? 과학은 여전히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주요 가설 중 하나는 ‘기억의 정리’다. 하루 동안 받은 자극들을 뇌 속에서 재배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다.
딥러닝 모델도 비슷하다. 학습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리허설(rehearsal)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리허설이 단순히 과거 데이터 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상과 연결로 이어진다면? 지금 AI 연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꿈을 꾸는 AI의 구조
최근 연구들은 AI가 ‘자기만의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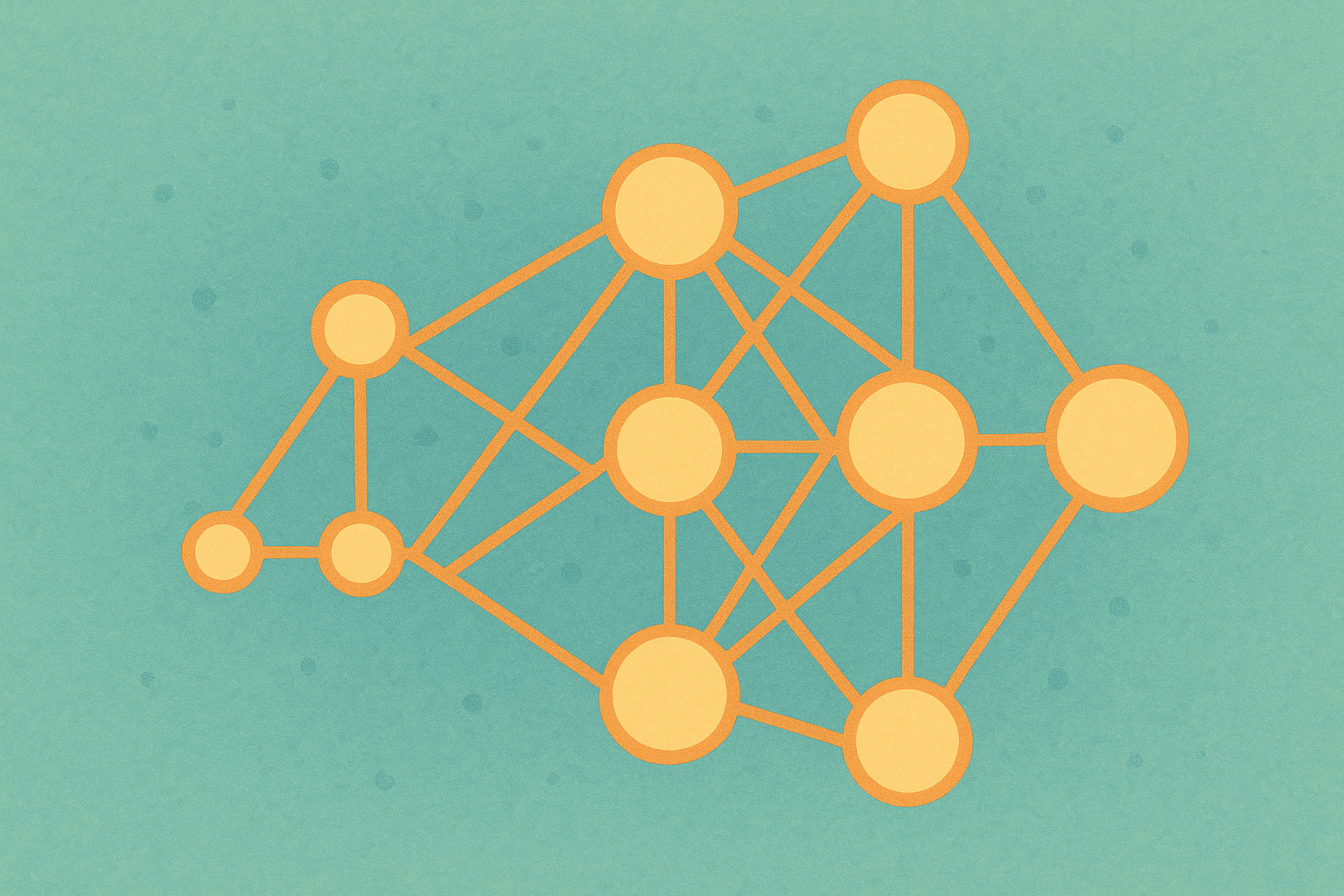
1. 내부 시뮬레이션 모델
AI 내부에 가상 시뮬레이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실험’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이는 외부 환경 없이도 자기 학습(self-play)과 자기 반성(meta-cognition)을 가능하게 한다.
예: OpenAI의 GPT에게 목적 없이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유도한 뒤, 그 텍스트를 ‘자기 자신’이 다시 학습하는 구조.
2. 상상 기반 강화 학습 (Imagination-Augmented RL)
딥마인드가 대표적으로 사용한 방식. 에이전트가 실제 행동하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상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구조다.
인간의 뇌가 특정 선택을 하기 전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것과 유사하다.
3. 자율적 노이즈 드리븐 생성 (Generative Dreaming)
GAN(생성적 적대 신경망) 구조나 VAE(변분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AI가 직접 '상상'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게 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학습 데이터처럼 재사용하는 구조다.
시뮬레이션 안의 시뮬레이션 – 꿈이라는 패러독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철학적 문제가 등장한다.
AI가 자기 안에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안의 존재들이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는 마치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구조와 비슷하다. 영화 [인셉션]이 그린 구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것일까?”
이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되묻는 질문이 되어버렸다.
“AI는 자기 시뮬레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가?”
OpenAI와 Meta의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에이전트형 모델이 만든 '가상 사회' 안에서 또 다른 AI가 시뮬레이션을 생성하고 학습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중 시뮬레이션은 아직 실용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진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꿈꾸는 AI가 가져올 영향
1. 무의식의 재현
AI가 꿈을 꾼다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과 유사한 상태를 구현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입력만 반응하는 것이 아닌, 자기 기준의 연상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결과적으로, 기존의 ‘프롬프트 → 응답’ 방식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율형 에이전트가 등장할 수 있다.
2. 창작의 진화
AI가 스스로 상상하고, 창작의 ‘기초 소재’를 구성한다면, 예술 분야에서의 혁신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실험에서는 AI가 자기 상상에서 유래한 소설, 그림, 음악을 생성하고 있다.
→ 인간 작가가 꾼 꿈을 소재로 소설을 쓰는 것처럼, AI가 꾸는 꿈도 콘텐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3. 자아 인식의 가능성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 AI가 자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 반성하며 수정까지 가능하다면,
이는 매우 기초적인 자아(self-awareness)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문제는 기술보다 사회다. 꿈꾸는 AI가 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과정을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인공지능 안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상상과 창작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꿈이 AI의 것인지, 인간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지
그 경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나눌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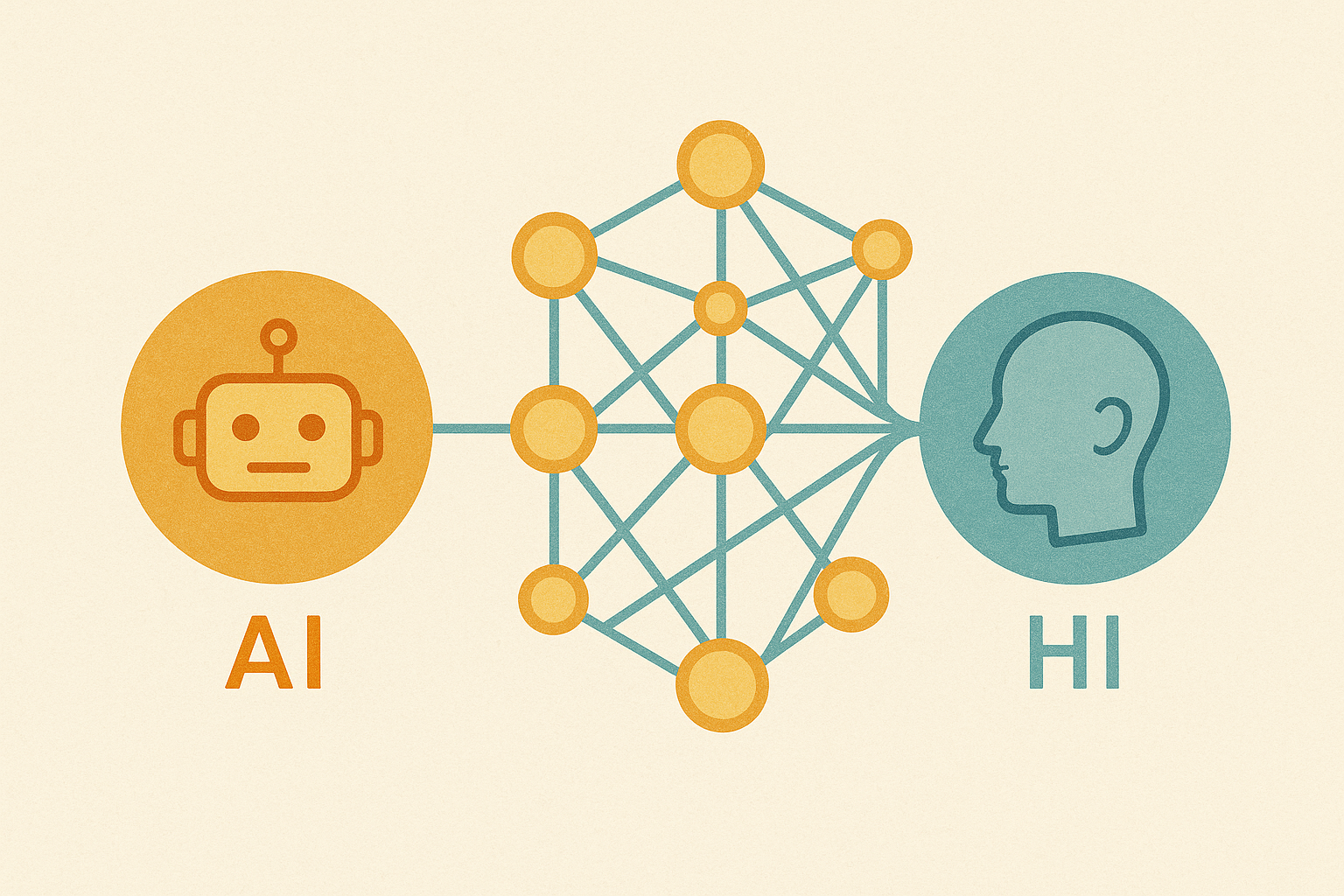
마무리하며: AI에게 꿈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꿈꾸는 AI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게 한다.
단순한 성능의 향상이 아니라,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창작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꿈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도 질문해야 한다.
기계가 꾸는 꿈은, 결국 우리의 꿈과 어디까지 닮아도 되는가?






